中 '순차→동시대응' 전환…사드에 남·동중국해 '동시 맞불'
송고시간2016-08-10 14:47
美와 신형대국관계 요구하는 中 자신감…그러나 난관 산적
사드·동중국해엔 거친 대응…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엔 물밑협상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과거에는 마찰을 빚는 상대국 가운데 우선순위를 가려 상대하는 '순차 대응' 방식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초강대국 미국처럼 '동시 대응'의 체제로 전환한 기색이 엿보인다.
우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이 한국과 미국, 동중국해 분쟁으로 일본과 동시에 대립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선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필리핀과 물밑 조율을 벌이는 등 중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선'을 펴고 있는 데서도 그런 양상이 드러난다.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중국이 이제는 대외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을 드러내놓고 구사하면서, 자국의 핵심이익을 사수하거나 쟁취하기 위해 동시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접근법에 대해 이미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설정을 공식화해온 중국이 대외정책도 그에 맞춰 수정한 것으로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물론 남·동중국에서 보인 중국의 태도가 '대국'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 상하이대학의 군사평론가인 니러슝(倪樂雄)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동시대응은 전 세계에 중국이 여러 지역의 분쟁에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현재 동시에 맞닥뜨린 사드·동중국해·남중국해 등 외교 현안 중 어느 하나도 쉽게 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中, 한반도 사드배치 도 넘은 비난에 반발 초래 = 중국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최근 며칠 새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연일 비난공세를 펴면서 철회 압박을 펴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관영 신화통신 등을 포함해 중국 대부분 매체는 북한의 안보 위협 탓에 초래된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이라는 한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하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판할 정도로 '금지선'을 넘은 모양새다.
인민일보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을 기사에 거론하며 "역내 안정을 깨뜨리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변 대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당·국가체제인 중국에서 인민일보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생각을 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당국자는 해당 기사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인민일보의 해당 보도를 계기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가 7일 별도의 입장 발표문을 내 '사드배치 결정이 북한 도발의 원인'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 주장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게 단적인 사례다.
내친김에 김장수 주중 대사는 8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에게 사드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사드배치의 근본 원인이 북핵 문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노력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거칠게 얘기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는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응하려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정도 이상으로 반응하는 중국에 서운함을 표시한 것이다.
중국의 주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사드 레이더에 중국의 군사시설이 노출돼 결과적으로 미국에 넘어가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레이더 역시 중국 군사시설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의 설명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 中, 센카쿠 열도 분쟁 지속적인 '자극' =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국·미국과의 '전선'이라면, 중국은 일본과의 오랜 갈등 전선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싸고 최근 부쩍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5일 중국 해경국 선박과 중국 어선이 일본이 자국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 처음으로 함께 접근했으며 8일까지 어선 수백 척을 비롯해 중국 측 선박이 일대에 반복해 등장했다. 8일에는 일본이 접속 수역으로 규정한 곳에 중국 당국의 선박 15척이 진입했다.
중국은 과거에는 해경국 선박과 어선을 센카쿠 열도 주변으로 보내 일본의 반발을 유도했다면 최근 몇 개월 새 군함까지 보내 일본의 거친 반응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중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사무차관,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외무성 행정관료 수준에서 중국 대사관 당국자에게 항의하거나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반복된 항의에도 중국 선박이 진입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자 항의 주체를 각료로 격상했다.
통상 갈등 대상국에 강한 불만을 쏟아낼 때 주재국 대사를 '초치'하면, 외교부의 차관보 또는 차관급이 상대하는 게 관례이고 일본 역시 그러했으나 이번에는 장관급인 외무상이 직접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이런 행위를 겨냥해 9일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다. 그러나 말싸움만 불렀다. 청 대사는 "중국 영토에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반박했으며,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관영 매체들도 최근 며칠 새 동중국해와 관련해 일본을 비난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이 이처럼 외교정책을 책임지는 기시다 외무상이 나섬에 따라 중국도 수위를 높여 이에 반박할 가능성이 있고, 갈등의 상대가 점차 상향조정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황 개선 효과가 없으면 중일 양국 관계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엔 中 필리핀과 물밑 협상할듯 = 남중국해 문제는 말 그대로 중국의 최대 핵심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변하는 중국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이후 그 이전과는 달리 중국은 '저강도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필리핀의 제소로 이뤄진 당시 재판 이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무력성 군사훈련을 강행하며 미국과의 '일전'도 할 수 있다는 강공을 지속했으나, 중재재판소의 중국 패소 판결로 국제적으로 명분을 훼손당하게 되자 가능하면 조용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판결 이후 중국의 매체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갑작스럽게 관심을 줄였다.
중국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제소국인 필리핀을 '회유'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제소국인 필리핀이 입장을 바꾼다면 기존 판결에 '흠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경제지원 카드도 활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적어도 물밑 작업은 시작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필리핀 정부의 '남중국해 특사'인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은 9일 홍콩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를 우호적으로 다루고 있다. 양측의 접촉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으나, 남중국해 갈등은 한반도 사드배치와 동중국해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 무대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공동 성명에서 빼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필리핀도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중국과 필리핀이라는 당사자 이외에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여러 회원국이 중국과 갈등하고 있고 미국 등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렸다는 점에서,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president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8/10 14:47 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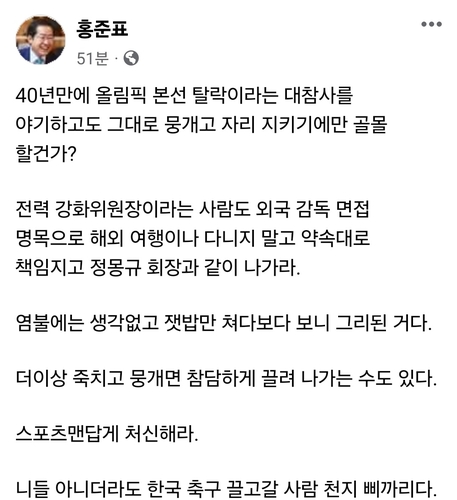


![[영상] 지도자 경력 '큰 오점' 생긴 황선홍…국대 감독 꿈 밝힌 신태용](http://img7.yna.co.kr/mpic/YH/2024/04/26/MYH20240426010500704_P4.jpg)
![[영상] '샐러리맨 신화에서 뉴진스 엄마' 민희진…기자회견 밈 폭발](http://img0.yna.co.kr/mpic/YH/2024/04/26/MYH20240426014400704_P4.jpg)
![[영상] 회사 앞에 또 카페가 생겼다…처절한 생존 경쟁](http://img7.yna.co.kr/mpic/YH/2024/04/25/MYH20240425010300704_P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