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차례도 익숙해요" 베트남인 서나래씨의 추석나기
송고시간2018-09-25 07:03
한국 생활 14년 차…전 부치고 튀김 튀기고, 차례상 준비도 익숙
"'명절 증후군'도 겪지만 즐거운 추석 보내는 게 과제라고 생각"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매년 추석만 되면 시어머니댁을 찾아 전도 부치고 튀김도 튀겨요. 처음엔 형님들 옆에서 재료만 준비했는데 지금은 제가 도맡아 요리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힘들지 않아요"
베트남 출신 서나래(36)씨는 2004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나이가 10살 더 많은 남편과 결혼해 경남 창원에서 살고 있다.
결혼 14년 차로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베트남 이름인 부이 튀튀도 한국식으로 바꾸었다.
그는 올해도 인근 함안군에 있는 시어머니댁에서 가서 남편, 두 딸과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낼 계획이다.
베트남에도 한국 추석에 대응하는 명절인 '뗏 쭝 투'(Tet Trung Thu)가 있으나 두 나라가 떨어진 거리 만큼이나 풍습도 사뭇 다르다.
베트남 추석은 한국의 '어린이날'에 더 가깝다.
이날 베트남 부모들은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녀들과 등불놀이를 하거나 사자춤을 구경하고 달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처음엔 한국 추석 문화가 낯설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추석만 되면 평소 잘 보지 못하는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음식도 만드느라 분주하니까요. 제 경우만 하더라도 추석에 모이는 사람이 12명 정도 돼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차례·음식 걱정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서 씨는 이전 요리 등으로 힘들었던 명절을 떠올리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추석 연휴 서 씨의 일과는 여느 평범한 한국 가정과 다르지 않다.
형님 두 명과 함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한 뒤 튀김이나 전 같은 음식을 한다.
추석 당일엔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차례를 지낸다.
여기에 서 씨만 하는 '특별 연례행사'가 하나 더 추가된다.
추석을 맞아 창원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이주민센터로 초청해 떡국 등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다.
이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경남으로 넘어온 베트남 이주민 정착, 통역 등 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남들보다 두 배 더 바쁜 추석을 보내는 셈이다.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아 평소 명절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양반이더라고요. 어떤 이주민은 도와줄 일손이 없어 장 보는 것부터 음식까지 모조리 혼자 하기도 해요. 애들 챙기랴, 음식 준비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곧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는 고향 베트남에 있는 가족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 씨는 한국으로 건너온 뒤 14년간 추석은 물론 베트남 최대 명절인 설에도 조국에서 지낸 적이 없다.
한국에서 하는 일에 가정까지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도 힘들뿐더러 수십만원이 넘는 비행기 티켓값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예전엔 4∼5년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 두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을 방문해요. 베트남 풍광이 이국적이고 예전 프랑스 식민지였던 탓에 유럽권 문화도 남아있어서 아이들이 언제 베트남 가냐고 졸라대서 피곤해요"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만큼 이곳 문화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도 추석이 되면 '명절 증후군'에 곧잘 시달린다.
특히 '언어 장벽'은 서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고 견고했다.
한국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정치부터 경제, 연예인까지 수다를 떠는데 단어가 어렵고 내용도 복잡해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 일쑤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야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지식과 배경 이해가 필요한 전문적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만 소외되는 것 같아 의기소침해진다.
여러모로 서 씨에게 한국 명절은 멀게만 느껴진다.
서 씨는 "아무리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내 나라 내 문화가 아닌 곳에 살면 쉽게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특히 더 그렇고요. 헤어지는 순간까지 웃으며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게 제게 남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더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아요"라며 추석을 맞은 이주여성의 마음을 표현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8/09/25 07:03 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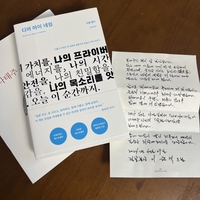






![[영상] "F-16 우크라 첫 배치"…공중전 우위 거머쥘 '게임체인저' 될까](http://img3.yna.co.kr/mpic/YH/2024/05/03/MYH20240503015400704_P4.jpg)
![[영상] 야구 '시구·시타 알바' 100만원…애니팡은 1천만원 알바 모집](http://img3.yna.co.kr/mpic/YH/2024/05/03/MYH20240503019800704_P4.jpg)
![[영상] 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http://img0.yna.co.kr/mpic/YH/2024/05/03/MYH20240503015500704_P4.jpg)


